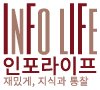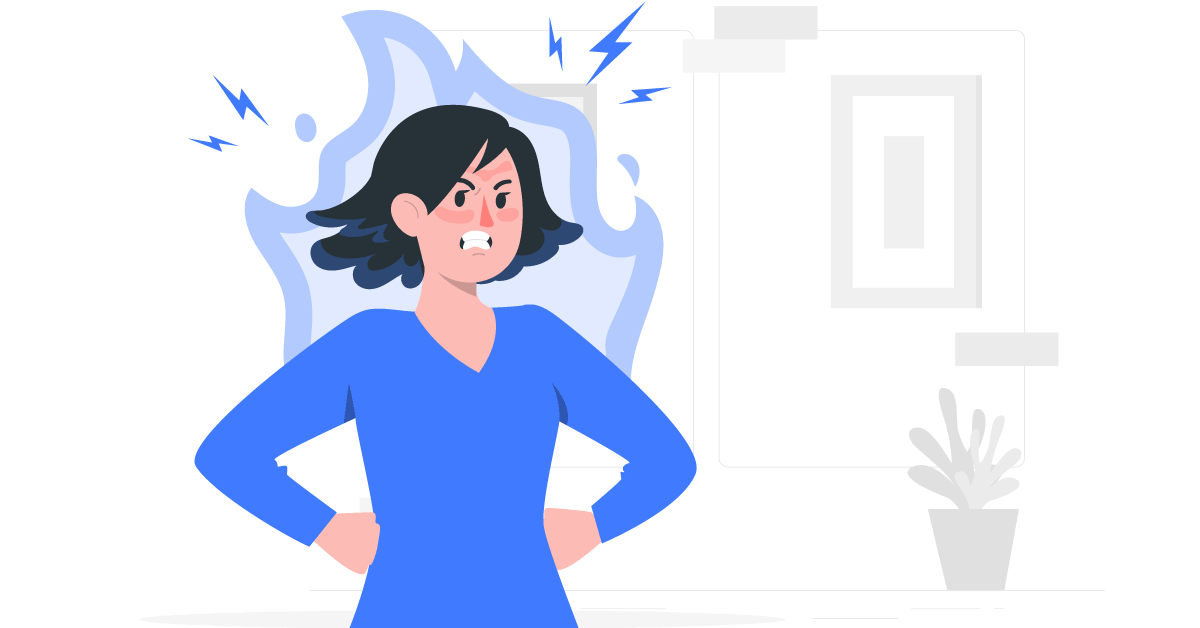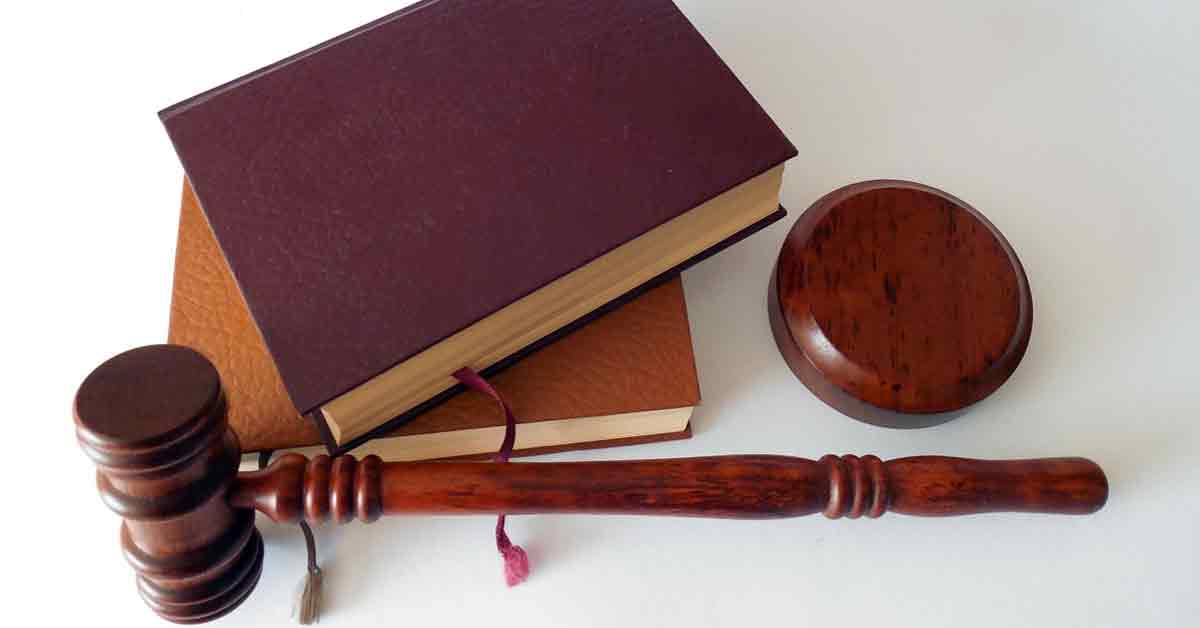생보사는 재해, 손보사는 상해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 재해와 상해가 크게 다르다.
필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를 재해와 상해에서 찾는다.
단지 상해보다 ①재해가 보장이 넓기 때문에?
그보단 상해 속 독소조항인, ②통지의무, 즉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주된 이유이다.
만약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어기고 변화를 알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약관과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심지어, 어기지 않고 제대로 알리고도 해지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의 재해와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이의 ①보장의 차이부터 ②알릴 의무의 차이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상해는 재해보다 보장되는 범위가 좁다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는 보장 자체가 다르다.
재해는 ①외래의 ②우발적 2가지 조건의 사고이면 보장하는데, 상해는 ①급격하고 ②우연한 ③외래의 3가지 조건의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단어가 재해의 [우발적]과 상해의 [우연한]이다.
[우발적 사고]와 [우연한 사고]에 차이가 있을까?
수많은 사고들이 [우발적 사고]이지만, [우연한 사고]는 아니어서 상해로는 보장 안 되는 일이 많다.
위와 같은 말로 교육을 하면 보험설계사들조차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견될 수 있는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게 아니어서 상해는 보장이 안 된다. 같은 사고라도 사고를 당하려 마음 먹은게 아니라면 우발적이어서 재해는 보장이 된다.
입산금지 / 입수금지 / 출입금지 / 다이빙금지 / 횡단금지 등, 우리는 다양한 경고문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고문을 어긴 행위로 일어난 일들은 사고가 예상될 수 있으니 우연한 사고는 아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키려한 것은 아니니 우발적 사고에는 해당된다. 즉, 상해는 안 되고, 재해는 된다는 얘기.
실제로 경고문이 없는 사고 상황에도 재해는 되고 상해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경고문이 떡하니 있었다면 상해는 거의 혜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상해는 평생 신상의 변동을 알려야 한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모든 보험은 연령/성별/직업/키∙몸무게/병력 등을 상세히 알리고 청약을 하게 된다.
이걸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 과정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계약 전에 알리는 고지의무는 모든 보험에 기본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 이후에도 직업/직무/탈것의 변동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손해보험의 상해에는 보험을 유지하는 도중에도 많은 것을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걸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들은 후 납득하며 계약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 없다.
보험계약은 보통 평생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평생 직업이나 하는 일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고민 끝에 보험을 샀는데, 온전히 내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끝없이 내 보험사에 나의 상황의 변화를 보고해야 하니.
꼼꼼하게 변화를 통지해도 큰 문제가 남는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알린다면 모든게 해결될까.
보험사의 입장에선 깔끔한 해결이자만, 가입자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낼 보험료가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덜 냈다며 목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알렸음에도, 일부 특약을 줄이게 되거나 심지어 해지당할 수도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달리 3년 견뎌도 소용없다
설계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고지의무위반은 체결하고 3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계약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즉, 고지의무위반은 3년만 견디면 된다는 것.
그런데, 계약 후 알릴 의무는 3년이라는 제척 기간1이 없다. 즉, 가입하고 몇 년을 견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 후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
여러가지 변화를 겪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이 아닌 나름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변화된 상황과 보험사고가 관련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따라가 보자.
계약 후 알릴 의무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들
앞서 말했듯 통지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고 납득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험업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부터, 필자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다.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큰 사례
보험업계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다. 전동 킥보드를 탄다고 알리지 않았다며 8.5억을 지급거절한 것으로 모자라, 모든 소송비용까지 유가족들이 덮어쓰게 된 일.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이런 소송은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 이 사건만의 특별함은 보험설계사들의 통지의무에 대한 시각과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데 있다.
소속 설계사는 물론 담당 콜센터 직원조차 .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 .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 기사 발췌
아래의 판례를 계기로 전동 킥보드를 포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와 관련한 담보들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매일경제: [단독] DB손보에 月80만원 꼬박꼬박 냈는데…"보험금 대신 소송폭탄"
필자가 직접 겪은 사례들
위의 큰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필자 또한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곤란을 겪거나 황당해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해왔다.
병원내 낙상으로 골절을 입었는데, 조사관이 나와서 직업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스스로 OO화재 설계사를 했던 사람조차 통지의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상해의 알릴 의무 차이는 약관 뿐만 아니라 상법에도 정의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사 약관만의 독소조항이 아니다. 상법에 버젓이 들어있는 보험사를 위한 보호조항들이다.
그래도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필자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상해 속에 여러 위험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해당상품들을 권유받고 가입하고 싶어질 수 있다.
왜 손보사 상품들을 가입하고 싶어지는 걸까.
핵심 원인은 설계사가 손보상품을 우선해서 권하기 때문이다.
설계사에겐 그렇게 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상품을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설계에 따라,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입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
각주
- 제척기간(除斥期間):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 기간. 말이 어려운데, 일정 기간이 넘으면 잘못을 묻지 못 한다는 것으로,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공소시효와 비슷하다 보면 된다.